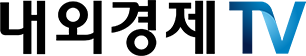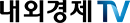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 중에서 마로(MARO)와 같은 '업비트 리스크'가 존재하는 프로젝트는 아하토큰(AHT), 하이브달러(HBD), 모스코인(MOC) 등 3종이다. 이들은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업비트에서만 거래 중인 프로젝트로 '나 홀로 상장' 중에서 위기가 아닌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전부터 내외경제TV 와치독 팀은 프로젝트 평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D), 위기(R), 경고(W), 주의(C) 등 4개로 분류했으며 ▲아하토큰(AHT) ▲하이브달러(HBD) ▲모스코인(MOC) 등이 내외경제TV가 분류한 D 등급이다.
즉 업비트의 정책에 따라 투자 유의만 지정되더라도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탓에 업비트가 프로젝트 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4일 내외경제TV 와치독 팀과 쟁글 리서치 팀이 공동 조사한 결과 업비트의 '나 홀로 상장' 비중은 ▲원화·비트코인 마켓 19종 ▲비트코인 마켓 15종 ▲원화마켓 4종 ▲비트코인·테더 마켓 3종 ▲원화·비트코인·테더 마켓 1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마켓캡(2022년 8월 2일 기준)에서 집계된 거래량 비율에서 업비트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캐리프로토콜(CRE), 디카르고(DKA), 그로스톨코인(GRS), 에브리피디아(IQ), 엠블(MVL), 온버프(ONIT), 리퍼리움(RFR), 스팀달러(SBD), 솔브(SOLVE), 스트라이크(STRK), 톤(TON), 썬더코어(TT), 센티넬 프로토콜(UPP), 밸리디티(VAL) 등 14종이다.
위에 언급된 프로젝트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업비트 리스크가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등으로 악재가 작용할 때 후폭풍까지 고려해야 한다.
비록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업비트에서 밀려나온 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시세로 거래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속칭 다른 거래소에서 처리하는 설거지로 전락할 수 있어 흔히 말하는 우량 프로젝트보다 위기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심각한 게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업비트만 거래하는 아하토큰(AHT), 하이브달러(HBD), 모스코인(MOC) 등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정기 공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마로(MARO)와 다르다.
일명 마로에 준하는 업비트 케어 프로젝트 3종으로 목적 거래소에 상장해 단일 거래소 리스크를 관리하는 종목에 비해 위험군으로 손꼽힌다.
앞서 언급한 센티넬 프로토콜도 핫빗의 이더리움 마켓 거래량 비중이 미미해 범위를 넓힌다면 예비 위험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