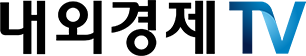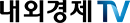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빗썸의 예치금 이자 4% 상향을 두고 거래소 업계가 시끄럽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 시작된 예치금 이자 상승 랠리는 흡사 코인과 주식의 동시호가 거래처럼 진행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개입으로 거래소 업계의 예치금 이자 전쟁은 빗썸의 삼일천하로 막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과거 특금법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 금융당국의 개입을 두고 해석의 여지는 분분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는 금융당국이 시장을 감시해 홀더를 보호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래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영역도 구체화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예치금 운용이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의문을 표한다. 빗썸의 예치금 이자 4%가 현행법에 따라 예치금을 보호와 지급,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의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감독규정에 명시된 '합리적'을 금융감독원이 확대 해석,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금융권의 잣대로 확대 해석하면서 벌어진 촌극에 불과하다.
현재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육하원칙 중에서 '왜'가 빠졌다. 특금법 시절에 존재하지 않던 이자 수익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회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까지 혜택으로 돌려줄지는 금감원이 아니라 바스프의 영역이다.
거래소는 가상자산(假像資産)을 사고파는 거래 수수료, 금융기관은 자금(資金)을 빌려주고 예대(預貸) 마진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으로 각자의 영역이 달랐기에 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누가 거래소에 여유자금을 맡기고 세금까지 내면서 이자 수익을 바라나.
속칭 코인 사려고 입금하고, 손절과 익절로 희비가 엇갈리는 출금할 때를 제외하면 선물, 현물, 마진 등 세금과 거리가 먼 투자가 있는데 이자 수익은 처음부터 거래소의 밥줄이 아니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현물 시장만 기형적으로 성장, 불공정과 이상 거래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특이점만 찾아내서 걸러내면 그만이다.
왜 법제화에 따른 성장통을 거래소가 아닌 금융당국이 앓고 있나. 국내외 거래소 업계에서 최단기 스테이킹 서비스로 연평균 보상 100%를 보장하는 플래시 딜을 선보일 때도 거래소를 옭아맬 것인지 궁금해진다.
거래소는 은행이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