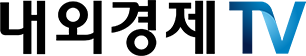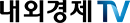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방향은 좋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정해두고, 미리 설계한 틀에 대안 없는 지적과 힐난은 잘못됐다.
최근 2024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의원이 제기한 빗썸 수수료 꼼수 지적은 어폐(語弊)의 수준을 넘어 무지(無知)가 느껴진다. 오히려 수수료 할인 쿠폰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숨겨놓고, 기존 수수료만 챙기려 했다는 사업자의 도덕성을 질타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생길 뻔했다.
국내 거래소 업계의 수수료(거래, 출금)는 각 사업자의 상장 심사와 상장 폐지, 에어드랍, 메인넷 지원 등과 같은 거래소 고유의 영역이다. 현물 거래(Spot) 밖에 하지 못하는 국내 바스프 비즈니스 모델에서 입법 기관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다.
경쟁은 좋다. 하지만 원화마켓에 존재하는 거래소 5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쟁은 되지 않는다. 현물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되는 탓에 마켓 메이킹 팀의 놀이터나 스캠 설거지 천국이 된 것도 오로지 현물 거래만 강제해 벌어진 촌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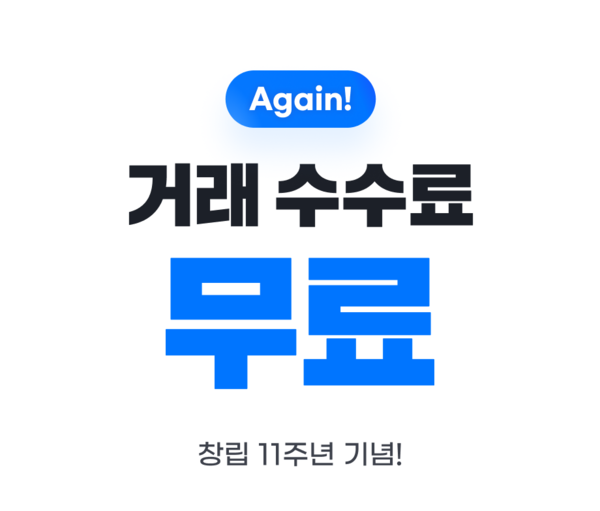
그렇다면 수수료를 꼼수로 거둬들인게 무조건 빗썸의 UI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먼저다. PC 버전에 접속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팝업, 스마트폰 앱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팝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합리적이다.
애초에 수수료 무료 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만 보고 판단,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아예 접속도 설치도 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해버린 셈이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처음부터 볼 생각이나 의지도 없이 오로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한 '숫자의 함정'에 빠진 잘못을 왜 사업자의 꼼수로 화살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내 바스프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자 40곳에서 거래 수수료로 폭리를 거뒀다면 십분 이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5곳에서 업빗썸으로 통하는 2강 체제로 굳어진 현실에서 '일단 때리고 본다'는 식의 지적은 국정감사에서 보일 행태가 아니다.
참고로 일본 금융청이 권한을 위임한 JVCEA의 1종 사업자는 33곳으로, 국내보다 적음에도 취급하는 암호화폐와 현물 외 파생상품 다각화로 거래소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수수료 불문율이 존재하지만, 사업자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시장경제 체제에서 생존 게임을 시작한 지 오래다.
유통업계의 CMS 쿠폰 사용을 두고, 매대에 놓인 쿠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당 마트의 매출 꼼수를 지적하는 게 말이 되나. 이쯤이 되면 거래소가 호가를 세분화, 거래 수수료 쪼개기도 꼼수라고 지적하고, 원화가 아닌 코인 출금 수수료가 사업자마다 다시 숫자의 함정에 빠져 100배 차이를 보인다며 몰아붙일 기세다.
그렇게 경쟁을 좋아한다면 경쟁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래소 1개, 은행 실명계좌 1개'의 제한을 풀어놓고 싸우게 해야 한다. 몇 번이나 업권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업비트나 빗썸을 견제할 수 있는 외래종을 풀어놓고 관리할 기준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국내 거래소만 죽이려 드나.
끝으로 빗썸을 비호해주거나 좋게 봐줄 이유는 없다. 빗썸은 까도 내가 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