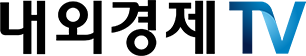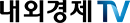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물 밑에서 눈치작전이 진행 중일까 혹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난 1일부터 국내 거래소 업계는 바스프 보유 물량의 매도가 허용됐지만, 현재까지 매도를 진행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호 매도 거래소'가 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원화 마켓 거래소보다 코인 마켓 거래소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DAXA,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매도 공시 게시판이 DAXA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다. 또 거래소들도 별도의 공시 게시판을 신설, 향후 바스프 매도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DAXA 측은 공시 게시판의 범위를 기존 DAXA 회원사 외에도 코인 마켓 거래소에도 허용했지만,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용한 거래소는 없다.

우선 매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의 법인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연히 법인 회원은 금융권의 실명 계좌 발급을 완료한 사업자만 해당하며, 이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원화마켓 운영에 필요한 실명 계좌와 ISMS 인증번호 획득 등과 다른 사안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업계의 법인 회원 가입 여부는 철저히 비공개다. 하반기 금융당국의 파일럿 테스트에 따른 제한된 투자운용사들이 거래소 업계로 유입, 법인 회원 가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법인 회원 가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일부 거래소 관계자가 법인 회원 가입 의사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설명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법인 회원 가입은 국내 거래소 업계의 불문율 중 하나다.
ㄱ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다른 거래소 법인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알아보겠지만,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스프의 매도 가이드라인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정작 조항 하나하나가 현행 법령보다 옥죄는 규제 천국이다.
그 결과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야?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바스프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Who)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바스프 신고 현황에서 영업 중인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거래소만 해당하며, 그 외 사업자는 매도할 수 없다. 비록 제도권에 진입한 사업자임에도 신고 사업자 27곳(2025년 5월 22일 기준)에서 거래소만 가능한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명시했지만, 정작 지갑과 커스터디 사업체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도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해 매각과 매도의 의미는 일치하지만, 매도 사업자와 매도 거래소를 구분한 것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다.
왜(Why)
세금 납부와 인건비 충당, 채무 청산 등으로 매도 목적을 한정한다.

언제(When)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돌아가며, 롱과 숏처럼 촌각을 다투는 초 단위의 전쟁터다. 그러나 매도는 평일만 가능하다. 공휴일법에 따라 영업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 규정했다.
거래소는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고, 속칭 던지기처럼 거래소가 시장에 물량을 투하하는 성격이 짙은 탓에 '평일 매도'로 제약을 걸어놨다.
문제는 매도 시점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시점의 의미는 약해진다. 예를 들면, 매도 계획의 시작은 이사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영업일 이틀 전에 공시, 실제로 팔겠다는 매도 예정일 3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즉 거래소의 물량 투하가 시장에 공개되는 시기가 3영업일 이전이다. 경우에 따라 시세 급락과 급상승을 노린 초단타 매매가 성행할 수도 있고, DAXA 공동 대응 종목으로 대응해 유의보다 촉구에 준하는 별도의 표기가 필요해진다.

어디서(Where)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 5곳에 팔아야 한다. 대신 셀프 매각은 금지되며, 2곳 이상 국내 거래소에 매도할 수 있다.
업비트는 빗썸과 코인원 그리고 코빗과 고팍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경우의 수처럼 원화나 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5곳의 거래소 법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How)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시세 조종과 불공정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현행 법령 위반이나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탓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바스프 보유 물량을 주식시장의 자사주 소각 개념으로 접근한 탓에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이질감이 존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매도 물량은 ▲최대 10% 이하(전체 매도 물량 기준) ▲매각일 기준 30일 이전 하루 평균 거래 물량의 5% 초과 금지(매도 거래소 기준) ▲시장가 매도 우선, 주문가는 시장가 대비 위아래 1% 범위 등으로 제한된다.

무엇을(What)
2개 이상 매도 거래소를 분산매도거래소로 정의했지만, 정작 매각할 수 있는 물량은 거래소 3곳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로 한정된다. 현금이 필요한 이상 테더 마켓이나 비트코인 마켓은 제외될 수밖에 없고, 원화마켓 한정이다.
예를 들면, 액세스 프로토콜(ACS)은 업비트와 빗썸만 취급하며, 빗썸과 달리 업비트는 원화 마켓 거래쌍이 없다.
오디우스(AUDIO)는 업비트, 빗썸, 코빗 등 3곳에서 거래 중이다. 하지만 업비트는 비트코인 마켓만 존재하고, 나머지 두 곳은 원화 마켓이다. 매도할 수 있는 거래소 3곳이라는 조건은 만족했지만, 매도에 유효한 조항은 약하다.
브렛(BRETT)은 업비트 테더 마켓, 빗썸과 코인원의 원화 마켓에서 거래 중이므로 거래소 3곳을 만족한다. 하지만 유효 거래쌍이 두 곳에 불과하고, 단순히 '5대 원화거래소 중 3개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발생한 특이 사례다.
이는 DAXA 회원사 중에서 업비트는 테더와 비트코인 마켓, 빗썸은 비트코인 마켓, 고팍스는 유에스디코인(USDC) 마켓 등이 존재, 오로지 원화마켓 한정이라는 공통 조건만 만족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DAXA 회원사 중에서 흔히 나홀로 상장이나 단독 상장으로 분류된 '바스프 Only'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불리하다. 또 두 군데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는 팔 수도 없다. 바로 여기서 맹점이 발생하는데 셀프 매각 시스템을 이용, 기존 거래소 2곳이 아닌 별도의 상장으로 거래소 3곳이 취급하는 프로젝트로 탈바꿈하면 그만이다.
즉 매도를 위해 거래소 3곳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으로 만들 수 있지만, 국내 거래소 업계의 시총 20위 이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불미스러운 일은 막을 수 있다. 이는 주식 자전거래의 순기능을 차용,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자본시장법의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