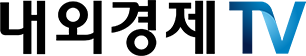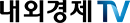최근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디파이, NFT, 레이어2 솔루션 등이 화제의 중심이다. 특히 최근 남발되고 있는 NFT는 확실한 비전이 없이 무턱대고 'NFT'만 언급하면 졸지에 테마 코인으로 낙점, 가격이 치솟았다가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NFT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결합, 차세대 먹거리이자 창작자와 구매자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그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디파이 열풍 이후 가격 상승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일부 프로젝트팀과 꾼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선동이라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의 7천만 원 시대에서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관련 생태계도 이전보다 견고해졌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디파이는 핀테크와 테크핀이라는 키워드로 포장돼 예금-적금-대출 등의 전통적인 은행의 기능을 구현, 투자자들을 이더리움의 생태계로 끌어들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이 거래소를 상대로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진행할 때 거래소의 '디파이' 관련 아이템 유무부터 확인한다는 말도 나온다. 시쳇말로 은행의 밥줄을 위협하는 거래소의 생명줄인 실명계좌를 주지 않겠다는 속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 결과 디파이보다 다른 업종도 품을 수 있는 NFT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게임 아이템부터 음악, 미술 등 엔터테인먼트를 품기 위한 업계의 눈물겨운 체질 개선도 시작됐다. 디파이보다 대중에게 친숙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NFT로 포장하면서 너도나도 NFT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남발되고 있는 NFT는 과거 UCC 열풍과 오버랩된다. 일부 프로젝트는 NFT에 특화, 발행부터 보관, 전송 등 생태계를 구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와 프로젝트팀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나머지는 단지 NFT 열풍에 탑승해 투자자들의 지갑만 노리는 스캠 수준이다.
단적으로 NFT 마켓은 무언가를 NFT로 변환해 사이트에 등록해 사고파는 곳이다. 즉 그게 원본이든 카피캣이든 일단 거래와 가격 중심의 시장으로 변질되면 NFT의 취지를 벗어난다. 원본이 가짜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NFT로 구현, 고가에 팔리면 문제가 없을까.
파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저작권의 수호천사 NFT가 원본 파일의 진위를 검증하지 못한다면 졸지에 타락천사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NFT 이면에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과 수수료 부담이 존재한다. NFT 발행 시 이더리움 외에 다른 멀티 블록체인을 선택하거나 수수료 절감과 생태계 구축 노력이 없다면 결국 스캠의 포장지로 NFT를 사용했다는 것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이 제도권 진입을 위해 디파이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디파이를 속칭 '유사 은행 서비스'라 생각하는 제도권(금융 업계)은 거부했다. 그래서 디파이 대신 NFT로 전략을 선회해 거래소도 NFT, 프로젝트팀도 자체 NFT 마켓으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분명 NFT는 어떤 사업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단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대세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스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