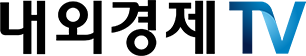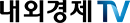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업비트와 빗썸의 렌딩은 파생상품일까. 그게 아니면 투기를 부추기는 악마의 선물일까.
국내 거래소 업계를 선도하는 업비트와 빗썸의 신규 서비스를 두고 말이 많다. 이들이 선보인 코인 렌딩은 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렌딩에 관련된 조항은 없다.
대부업법에 명시된 '금전의 대부'와 달리 현행 법령은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대행 등으로 구분한 바스프의 사업 행태와 다른 탓에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으니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견과 이전과 달라진 시장 분위기와 사업자의 위상 덕분에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적어도 국내 거래소 업계는 이전부터 불문율이 존재했다. 스테이킹과 렌딩, 마이닝 풀, 렌딩 등의 용어는 자칫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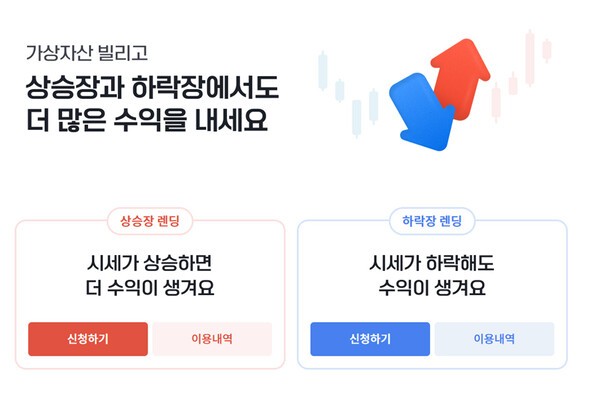
이전부터 현물 거래 외에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선물과 마진 등 별도의 파생 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투자가 투기로 일순간 바뀔 수 있어 언급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미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기에 렌딩과 선물은 고수익과 비례해 위험도도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업계의 1, 2위 사업자가 앞다퉈 렌딩 서비스를 선보인 시기가 묘하다. 투자자 보호에 실정을 맞춘 법령과 배치되는 서비스를 확충, 청산의 위험이 있음에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내외부에서 검토를 거쳐 선보이는 서비스 개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가 있다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 중단, 문제가 없다면 서비스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만약 빗썸이 대여 비율을 4배가 아닌 8이나 16배로 했다면 투기를 부추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청산 전문 바스프로 거듭났을 것이다.
물론 현물 거래 외에 수익 모델의 부재가 현재 기형적인 국내 거래소 업계의 알트코인 상장으로 이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렌딩이 끝일까. 렌딩을 시작으로 각종 파생상품을 서비스 형태로 선보인다면 결국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만 드러내겠다는 심보다.
그게 아니라면 바이낸스처럼 최소 50배나 125배 비율로 제대로 해보시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