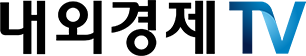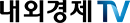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를 두고, 게임업계는 '닥치고 사냥'이라는 말부터 떠올린다. 흡사 레벨업을 위해 퀘스트와 미션을 모두 생략하고, 오로지 아이템 파밍과 레벨업에 집중하는 극단적인 플레이 방식이지만, 간혹 남의 몬스터를 사냥하는 스틸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DAXA는 이전부터 공동 대응 종목을 두고 고무줄처럼 결과가 엇갈린 일부 프로젝트가 존재했다. 그때는 DAXA는 권고할 뿐이며, 사업자의 고유 권한에 따라 거래 유지와 거래 종료를 이어가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어도 DAXA는 침묵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위믹스는 공동 대응 종목 지정과 두 번의 연장을 거쳐 결국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상장 폐지로 확정했다면 재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연장 없이 바로 정리했다면 오히려 덤덤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위메이드는 해킹 원인 판명과 중간 경과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했다.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갈 정도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과거 DAXA와 악연을 떠올린다면 전혀 다른 행보를 선택, 낮은 자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DAXA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했다. 이를 두고 이상할 정도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앞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겠다'는 각서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불거졌다.
국내외 프로젝트는 덱스(DEX)나 디파이 등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서비스의 보안 강화가 필수다. 그럼에도 해킹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뺏겼거나 월렛에 보관된 물량이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면 재기할 기회가 없다. 입장을 바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으니 법인을 폐업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60여 일의 시간에 DAXA가 위믹스 방출과 잔류를 두고,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위메이드 측의 주장처럼 물리적인 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 결론을 정해둔 상황에서 시간 벌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위믹스 재상장 전후로 거래소 4곳에 뿌려진 에어드랍 물량을 두고 말이 많다. 거래소가 매입한 것도 아니면서 각종 프로모션으로 재상장 이벤트를 진행하더니 일순간에 상장 폐지로 돌아선 행태를 두고 상도덕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래서 거래소는 속칭 손절이 아닌 익절로 응수, '위믹스의 단물만 빼 먹고 버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언급한 해킹은 비단 위믹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킹 이후 24시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특금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명시된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없다면 DAXA는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위믹스 이전 다른 프로젝트도 해킹 이슈가 있었지만, 국내 프로젝트팀이 아닌 관계로 신고와 공유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즉 이에 따라 국내 프로젝트팀은 국외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등이 겹치면서 차별의 가중치가 커졌다.
이전부터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했음에도 DAXA는 사안에 따라 대처한다는 융통성이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늘어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공동 대응은 DAXA, 개별 대응은 거래소마다 응수하는 변덕스러운 결정 놀음으로 전락했다. DAXA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수호자라면 정작 DAXA가 변질되면 이를 감시할 자는 누구인가.
자료가 오염되면 결과도 오염된다는 IT 업계 불문율에 따라 DAXA는 해체가 답이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