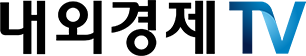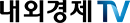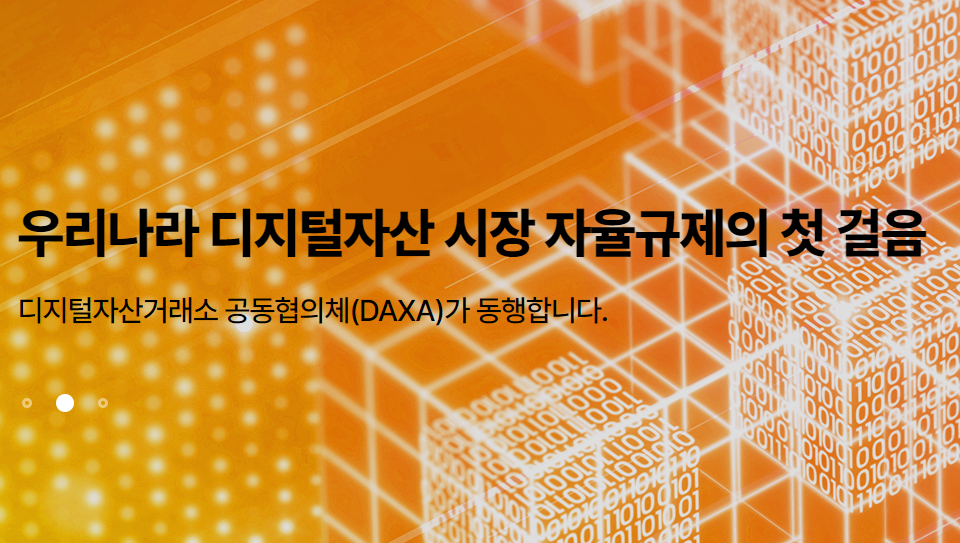
[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DAXA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무비블록(MBL)으로 시작해 경고와 촉구, 유의와 상장 폐지, 재심사 등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DAXA의 경고장을 받은 프로젝트들의 명암은 엇갈렸다. 경고를 받아들였거나 이에 불복하거나 혹은 유감을 표하며, 저마다 의견을 주창하며 DAXA를 향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DAXA는 사단법인도 아닌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까지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익단체다. 이를 두고 거래소 업계의 의견보다는 5개 사업체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일종의 어용 단체라는 비아냥도 쏟아낸다.
특히 DAXA의 유의 종목 지정부터 연장, 종료로 이어지는 속칭 DAXA 메타를 두고, 거래소의 고유 권한을 DAXA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와 빗썸의 프로젝트 재심사 기간이다.
이들은 DAXA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2주와 30일 심사기간을 고수했지만, DAXA 합류 전후로 심사 기간의 개념이 사라졌다. 단적으로 빗썸은 30일 재심사를 약관 변경으로 무통보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조항으로 수정했다.
앞서 언급한 무비블록 이후 지난 1년간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최근 벌어진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사태에 대해 DAXA는 공식적인 설명이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DAXA 측은 회원사 내부 시스템 통제와 프로젝트 중심의 위험 지표부터 대응하는 과정이 우선시됐고, 외부에서 벌어진 이슈 대응에 대해서는 점차 케이스 스터디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바(KAVA)나 웨이브(WAVE)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상폐와 잔류 여부 등이 이전에 DAXA가 언급했던 프로젝트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페이코인(PCI)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금법과 금융위의 움직임에 따라 휘둘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A 거래소 관계자는 "DAXA는 협의체를 가장한 이익단체일 뿐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거래소의 수익모델은 오로지 현물 거래뿐이다. 스테이킹은 서비스의 개념일 뿐 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DAXA나 VXA에 소속된 사업자의 수익 모델은 프로젝트 상장 후 사고파는 거래소 수수료에 의존한다. 바로 이 구간에서 병폐가 발생하는데 상장피 논란부터 깜깜이 상장, 프로젝트 러그풀 등을 지켜보는 거래소의 대응을 두고 이른바 세력의 장난이라고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회원사의 수익 보전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에 치중한 나머지 외부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유의, 주의, 촉구 등 면피성 단어를 선택, 실질적인 거래 지원(상장)과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선정 과정에서 우왕좌왕했던 것도 DAXA의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된 지 오래다.
블록체인 3원칙 중에서 투명이 제일 먼저 언급되지만, 정작 DAXA는 출범 직후부터 불투명과 불공정 논란에 시달렸다. 이쯤 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1년에 걸쳐 노력했는지 곱씹어 볼 시기다.
그게 아니라면 DAXA의 무용론은 다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