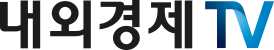[내외경제TV 칼럼] 예전에는 흔하게 사용하던 말들이었으나 생활방식이 바뀌면서 사라져 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정, 벗, 삶, 연애, 이런 말들이 생활에 녹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말들은 사라지고 페친, 인생, 사귄다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잊혀가는 말 중에 '설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새로 몸을 단장하기 위한 옷이나 신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60년대만 해도 부잣집이 아니고는 1년에 설이나 추석 때만 새 옷을 사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이 많은 부모님들은 명절 차례상 차리는 걱정보다, 자식들 설빔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는 옷의 종류도 많지 않았지만, 옷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옷감 재질도 요즘처럼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1년만 입어도 바지의 무릎 부분이나, 윗도리의 팔꿈치 부분이 빨리 닳아서 꿰매 입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온종일 논밭에서 일하신 어머니가 등잔불 앞에 앉아 옷이나 양발을 꿰매시는 모습은 어느 집이나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꿰매시는 동안 입고 있을 옷이 없어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거나, 팬티차림으로 앉아 있으면 당신이 살아오시는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쉬엄쉬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에 콧잔등이 시큰거립니다.
어머니가 꿰맨 옷을 입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또래 대부분 비슷한 옷을 입은 까닭입니다.
겨울에는 나일론 소재의 재킷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음이 언 냇가에서 썰매를 타다보면 옷이 물에 젖습니다.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면, 옷이나 양말이 젖은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나일론 소재는 불에 약해서 불길이 슬쩍 스치기만 해도 녹아 버리거나 눌어붙습니다.
그런 날은 어머니에게 꾸중 들을 것이 두려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집 근처를 배회하며 부엌에 계신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언젠가 어머니가 알게 되시고 꾸중을 듣게 될 터인데 그렇게 가슴 조이며 추위에서 떨었었는지 웃음이 납니다.
스웨터라는 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은 편물점에서 짠 스웨터를 교복 안에 입었습니다. 가격이 낮지 않아서 어머니들끼리 스웨터 계를 만들어 차례대로 편물점에서 옷을 받아 입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은 '단벌 신사'가 많았습니다. 어렵게 산 외출복은 소매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입는 것은 기본입니다. 양복은 친지의 경조사나 멀리 볼일을 갈 때나 입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고 부터는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계절 따라,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돈의 여유가 있을 때도 옷을 사 입습니다. 옷감의 재질도 좋아져서 몇 년을 입어도 꿰맬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기능성 옷이 유행했습니다. 작업복, 운동복, 등산복 등이 보편화 되면서 옷도 고급화되기 시작합니다. 수입 모사로 짠 양복은 중소기업 근로자 한 달 월급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비싸고, 유명 기업에서 만든 양복도 몇십 만원은 훌쩍 넘기 일쑤입니다.
요즈음은 브랜드 아웃도어 같은 경우 몇십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계절별로 입는 옷도 뚜렷해서 사계절 입을 것을 사려면 몇백 만 원을 줘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얼마나 비싼 아웃도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는 풍토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해인가 '노스페이스' 패딩이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알 턱은 없을 겁니다. 어른들이 비싼 옷을 사 주면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한 결과입니다. 티 없이 맑게 푸른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은연중 편 나누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60년대에만 해도 옷을 장롱에 넣는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벽에 박은 못에 걸어 두거나, 상자에 담아 윗목 시렁 위에 보관했습니다. 요즘에는 유행에 따라 철 따라 옷을 사다 보니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늘어갑니다.
도시 주택가에는 '옷 수거함'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입을 수 있지만, 유행이 지났다거나, 몸이 커졌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옷이 수거함에 쌓입니다. 수거함에 모인 옷들은 수집업자들이 세탁해서 아프리카나 인도 네팔 등에 수출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저개발국가에는 헌 옷을 수출하고, 미국에서는 헌 옷을 수입하여 '구재옷' 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이 주최한 제15회 세계 외국인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인도인 야덥부펜들은 '한국의 독특한 등산문화'를 주제로 말을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조차 저런 비싼 등산복을 입지 않는데, 천 미터도 안 되는 산에 올라가면서 저렇게 값비싼 옷을 입고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1960년대를 기억하지 않아도 깊이 성찰을 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인격이나 품격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브랜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따라서 입는 풍토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원짜리 등산재킷 대신, 10만 원짜리로 구입하고 40만 원은 여행경비나, 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다면 분명 품격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